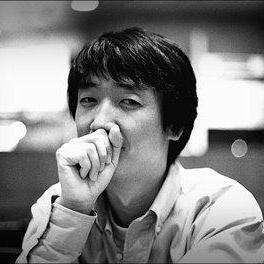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보며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에서 불거진 퇴직금 미지급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문제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돈을 떼먹은 사건이 아니라 취업규칙을 악의적으로 개정하고, 그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훨씬 크다.
법과 판례가 말하는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간단하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퇴직금 지급.
- 법원·노동청 해석은 더 명확하다.
- 근로자가 중간에 주당 근무시간이 줄어 15시간 미만 구간이 발생해도, 그 기간만 제외하고 합산해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다. 퇴직금은 장기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것.
쿠팡의 취업규칙 개정
쿠팡 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2024년에 걸쳐 두 차례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핵심은 “중간에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전체 근속을 초기화한다”는 조항이다.
즉, 11개월 동안 성실히 일했더라도 마지막에 잠시 근로시간이 줄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근속이 무효가 된다.
결국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다. 그리고 이미 언급했지만 더 중요한 사항인 근로자들에게 변경 내용의 통보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예시로 보는 차이
-
법원·노동청 기준
A씨가 1년 동안 근무했고, 7월 한 달만 주 10시간 일했다고 하자.
→ 7월은 제외하지만, 나머지 11개월은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쿠팡 규칙 기준
동일한 A씨의 경우, 7월에 15시간 미만 구간이 나왔다는 이유로 전체 근속이 리셋된다.
→ 8~12월 5개월만 인정 → 퇴직금 없음.
이런 구조라면, “퇴직금 받을 권리”는 사실상 회사 마음대로 사라진다.
숫자로 보는 규모의 불균형
쿠팡은 영업 실적만 놓고 보면 이미 거대한 기업이다.
2025년 1분기만 해도 약 2,15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연간으로는 약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임원 보수 역시 눈에 띄는데, CFO는 약 144억 원, 법무총괄은 약 73억 원, 국내 사업 대표급 인사는 약 67억 원을 보수로 받았다.
반면, 미지급된 퇴직금 규모는 언론 추정치 기준 약 2,000억 원대다.
즉, 회사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나 일부 임원들의 보수 규모에 비춰보면, 충분히 지급을 하고도 남는 액수다. 속된 말로 떡을 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는 “돈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규모와 여력을 고려했을 때, 퇴직금 지급은 기업 입장에서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한 것은 기업 윤리 차원에서 더 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왜 이런 짓을 벌여야만 했을까?
Note
위에서 언급된 영업 이익과 임원들에 대한 임금에는 환율 변동, 보고 시점 차이, 공시 기준 차이 등으로 인해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이 사건에서 가장 악의적인 부분은 규칙을 바꾸고도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 내부 문건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퇴직금 규정이나 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 규칙이 바뀌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했다.
-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퇴직 직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단순한 퇴직금 미지급을 넘어, 근로자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속이고 차단한 행위라 볼 수밖에 없다.
행정과 검찰의 대응
노동청에는 퇴직금 체불 진정이 폭증했다. 일부 지청은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회사는 불응했다.
노동부는 퇴직금 회피 목적이라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버렸다.
피해자들은 현재 이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
즉, 아직 법원의 본격적인 판단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상황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
해외에서는 기업이 퇴직금·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취업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제재성 벌금과 대규모 손해배상이 실제로 작동한다.
- 미국(캘리포니아): 퇴사 시 최종 임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30일치 임금을 벌과금 성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대기시간 페널티).
- 미국(NLRB): 노조와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일방 변경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원상회복 + 소급 임금 지급 명령.
- 독일: 고용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건당 최대 2,000유로 과태료.
- 영국: 집단정리해고 협의의무를 위반하면 근로자에게 최대 90일치 임금(Protective Award) 지급 명령.
반면 한국은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으나, 실제 처벌 수위는 낮고 “벌금 내고 끝”인 경우가 많다.
즉, 해외에 비해 실효성 있는 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외 vs 국내 비교표
| 행위 유형 | 해외 처벌/구제 | 국내 처벌/구제 |
|---|---|---|
| 퇴직금·임금 미지급 | 미국 – 최종 임금 미지급 시 하루 임금 × 최대 30일(Waiting Time Penalty) |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근로조건 일방 변경 | 미국 NLRB – 원상회복 + 소급 임금(backpay) | 부당노동행위로 시정명령·과태료, 실무상 원상회복 중심 |
| 취업조건 변경 미통보 | 독일 – 건당 최대 €2,000 과태료 | 근기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과태료 가능 |
| 집단적 해고 미협의 | 영국 – Protective Award, 최대 90일분 임금 지급 | 대량해고 협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보고·협의 절차 위반 제재 |
👉 요약하면, 해외에서는 기업이 규정을 악의적으로 바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만들 경우 실질적으로 아픈 처벌이 뒤따른다. 반면 한국은 법 조항은 있어도 처벌 수위와 집행력에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점이 대비된다.
결론
쿠팡 사태는 단순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취업규칙을 바꾸고도 알리지 않은 것, 즉 노동자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차단한 행위라는 점에서 훨씬 악의적이다.
퇴직금은 노동자가 장기간 근무하며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
그 권리를 회사 규칙 하나로 무력화하고, 심지어 그 사실조차 숨겼다는 것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기업 윤리 부재의 상징적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러한 악의적인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정신적·경제적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을 직접 겪게 된다.
법과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이 사건의 무게는 단순한 기업 내부 규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이기도 하다.
어쩌면 “쿠팡(Coupang)”이라는 이름도 아이러니하다. 불어 coup가 뜻하는 ‘일격, 불법적 권력 찬탈’처럼, 이 사태는 회사가 법과 제도의 최소한의 안전망에 날린 부당한 일격(coup) 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지금의 사태를 적법한 절차와 법 집행을 통해 응징하지 않는다면, 이 부당한 일격은 일회성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지속적인 공격이 될 것이며, 사회 전체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전례로 남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
California DIR FAQ (Waiting Time Penalty)
캘리포니아 주 노동기준집행국(DLSE)에서 제공하는 공식 FAQ.
퇴사 시 기한 내 최종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일일 임금 × 최대 30일분을 벌과금 성격의 "대기시간 페널티"로 지급해야 한다.
👉 https://www.dir.ca.gov/dlse/faq_waitingtimepenalty.htm -
California Labor Code §203 해설 (Dalton Employment Law)
캘리포니아 노동법 §203을 해설한 로펌 블로그 글.
최종 임금 미지급이 의도적 지연으로 인정되면 하루 임금 단위로 벌과금이 누적되며, 최대 30일까지 산정됨을 설명한다. 기업에 강한 억제 효과를 주기 위한 제도임을 강조.
👉 https://daltonemploymentlaw.com/understanding-californias-waiting-time-penalty-law/ -
Reuters: NLRB, 일방 변경 기준 강화 (2024-12-11)
미국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사용자들의 근로조건 일방 변경을 제한하는 기준을 강화했다는 보도.
노조 동의 없이 조건을 바꾸려면, “명확하고 확실한 포기(clear and unmistakable waiver)”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판결.
👉 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nlrb-raises-bar-employers-change-work-terms-without-bargaining-2024-12-11/ -
Noerr: 독일 취업조건 서면 통지 의무 위반 과태료 규정
독일 증빙법(Nachweisgesetz) 개정 내용 해설.
고용 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최대 €2,000 과태료 부과 가능.
👉 https://www.noerr.com/en/insights/stricter-notification-obligations-in-employment-relationships -
GOV.UK: 영국 Protective Award 가이드
영국에서 집단정리해고 시 협의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되는 제재성 제도.
법원이 근로자에게 최대 90일분 임금을 Protective Award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https://www.gov.uk/guidance/explaining-your-protective-award -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벌칙)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인과 책임자 모두 양벌규정 적용 가능.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12&lsiSeq=239311